
▴오수영 박사( RTS 기독교철학, 변증학교수, Ph.D)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가 예장합동 109회기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다락방 재영접설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이에 대해 RTS 신학교수인 오수영 목사는 진용식 목사의 주장은 다락방전도운동의 신학적 입장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며 그 오류를 지적하고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 근거한 다락방전도운동의 영접에 대한 이해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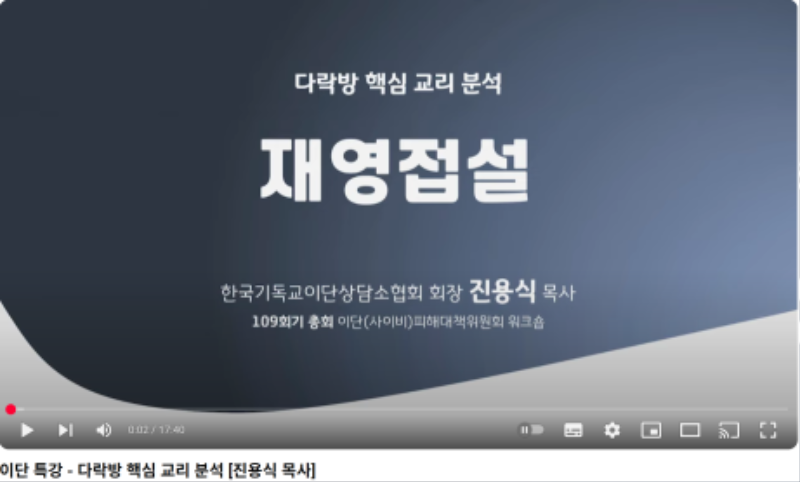
▴
[다음은 오수영 박사 반론 전문]
다락방전도운동을 '재영접설'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반박과 정통성 해명
모 이단연구소의 J 목사는 다락방전도운동의 영접 개념을 분석한 후, '재영접설'로 규정하며 이를 이단성의 근거로 삼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락방전도운동의 신학적 입장을 왜곡한 주장으로, 본 반박문은 그 오류를 밝히고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 근거한 다락방전도운동의 영접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제시하고자 한다.
1. 구원의 본질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영접)은 도구적 수단(원인)이다
다락방은 '영접기도'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이 주어진다고 믿는다. 즉, 구원의 본질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영접)은 그 은혜를 수용하는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원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존 칼빈은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이다"(『기독교 강요』 III.11.7)라고 말한다. 헤르만 바빙크 역시 "믿음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주입되는 관과 같다"(『개혁교의학』 IV권, 220쪽)고 말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CF 11.1)에서도 “오직 믿음만을 그 의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여기신다”고 밝히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은 구원의 단순한 도구적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다락방전도운동은 정통 교리에 근거한 신학 위에 서 있으며, 이에 따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또한 ‘영접’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그것은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집 『RUTC 1』(137쪽)에 따르면 “믿고 영접하는 것” 또는 “참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바 ‘믿음’과 ‘영접’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속 사역의 두 측면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락방은 믿음과 영접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하거나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적 맥락에 따라 이 둘을 구원의 사역 안에서 나타나는 두 측면으로 이해하며, 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존 머레이(John Murray)는 “믿음은 진리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분을 신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신뢰는 반드시 영접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한다”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Eerdmans, 1955), p. 106]고 말함으로써 ‘영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벌코프 역시 "믿음은 온 영혼의 활동이다...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적인 신뢰와 그분의 인격을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96), p. 504]고 말함으로써 내적인 믿음과 그 외적인 영접을 구속의 양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바빙크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의 행위, 즉 내적으로는 신뢰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Reformed Dogmatics, Vol. 4 (Baker Academic, 2008), p. 123]이라고 말함으로써 영접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요 1:12에서 ‘믿음’과 ‘영접’이 동일한 구속 사역에 대한 두 측면, 즉 신자의 전인적 반응임을 강조한다. 믿음은 마음의 내적 신뢰이며, 영접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인격적 수용이다. 다락방 역시 믿음과 영접을 분리된 시간적 선후 단계로 확정하지 않고, 동일한 구속 사역의 양면, 곧 논리적 관계로 이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계라는 말을 쓴 것뿐이며, 이는 ‘시간적’ 질서가 아닌 ‘논리적’ 질서로서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믿음(영접)을 구원의 도구적 원인으로 보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러한 영접 자체가 믿음이다" (칼빈의 요한복음 주석 1장 12절). 바빙크 역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단이다. 이 믿음에는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포함된다"[Reformed Dogmatics, Vol. 4: Holy Spirit, Church, and New Creation, Baker Academic, 2008, p. 123]고 말함으로써 영접은 믿음이며, 구원의 도구적 원인임을 분명히 한다.
벌코프도 동일한 의미로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도구적 원인임을 밝힌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구원하는 믿음은 칭의를 얻는 도구적 원인이다"[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96, p. 503]. 이를 통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람바노(영접)는 구원을 위한 도구적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락방이 믿음(영접)이 구원에 이르는 도구적 원인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며, 영접을 “구원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오류이다.
2. 영접 개념과 요 1:12 해석에 대한 오해
J 목사는 다락방이 영접을 헬라어 ‘데코마이’(δέχομαι, 모셔들이다)로 해석하여 지방교회의 교리를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주장이다. 다락방은 영접을 ‘데코마이’(δέχομαι)로 명시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영접’의 진정한 원어적 의미를 살린다면 ‘람바노’(λαμβάνω)의 의미와 연결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다락방에서는 전도 과정에서 ‘데코마이’나 ‘람바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거나 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락방에서의 영접을 ‘데코마이’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또한 ‘데코마이’(δέχομαι)와 ‘람바노’(λαμβάνω)에 대한 주석적 설명 역시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으로 나열할 뿐이며, 신학적 오류와 분석의 불충분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 변증하고자 한다.
첫째, 다락방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람바노’(λαμβάνω)와 ‘데코마이’(δέχομαι)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원어를 밝혀 사용한 경우를 보면 ‘람바노’로 밝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장복음메세지>, 제9과 ‘질병과 치유Ⅰ’). 요한복음 1:12에서 ‘영접하다’는 헬라어는 ‘람바노’(λαμβάνω)이며, 이는 ‘받다’, ‘취하다’의 뜻을 가지며,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락방은 ‘람바노’(λαμβάνω)와 ‘데코마이’(δέχομαι)를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영접에 대하여 일반적인 전도 언어에서 수용된 표현(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인다")을 사용할 뿐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인다"는 의미에서 '영접'이란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다락방 뿐 아니라 대표적 교단과 선교단체 등에서도 흔히 확인된다.
이는 합동 측 전도 세미나 교재나 ‘4영리’ 전도 책자 등에서도 영접은 "예수님을 모셔들인다"는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모셔들인다’는 표현은 다락방만의 특수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96회기 전도 세미나 교재(p.28)에 나오는 영접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예장 합동 측에서 영접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모셔들입니다>라는 표현은 과연 요한복음 1:12의 ‘람바노’(λαμβάνω)와 같은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데코마이’(δέχομαι)의 뜻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J 목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해당 표현은 오히려 ‘데코마이’(δέχομαι)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또한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도책자 <4영리>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미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영접’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인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람바노’(λαμβάνω)와 ‘데코마이’(δέχομαι)에 대한 J 목사의 분석은 그 본질적 진의를 간과하고, 단편적인 단어 나열에 기초해 다락방의 영접을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는 다락방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못 해석했다며, ‘데코마이’(δέχομαι)를 주님의 영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락방전도운동에서는, 엄밀히 말해 ‘영접’ 개념을 ‘데코마이’(δέχομαι)가 아닌 ‘람바노’(λαμβάνω)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다락방의 대표적 전도 훈련 교재인 『현장복음메시지』 제9과 「기도와 치유 Ⅰ」에서는 “요 1:12 – 영접(람바노, λαμβάνω): ‘굳게 붙든다, 취한다’는 의미”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락방이 ‘영접’을 ‘데코마이’(δέχομαι)로 설명한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의 영접 개념을 고의적으로 ‘데코마이’(δέχομαι)로 오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교회 교리의 차용’ 혹은 ‘재영접설’ 운운하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기반한 자가당착적 무고(誣告)이며 신학적 정직성을 결여한 비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진 ‘데코마이’(δέχομαι)와 ‘람바노’(λαμβανω)에 대한 해석 역시, 원어에 대한 불충분한 분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데코마이’(δέχομαι)를 “영접하다, 들이다”로, ‘람바노’(λαμβάνω)를 “취하다, 가지다, 빼앗다, 받다, 옷 입다, 주웠다” 등으로 제시하며 그 둘을 완전히 분리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밝혔듯,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해에서 완전히 이탈한 자의적 해석이며, 크나큰 오류이자 피상적인 원어 이해에서 비롯된 학문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는 더 나아가 다락방의 영접 이해가 지방교회에서 차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사실적 근거 제시 없는 주관적 확증 편향에 따른 악의적인 이단 몰이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람바노’(λαμβάνω)와 ‘데코마이’(δέχομαι)는 J 목사의 설명과는 달리, 두 개념의 상호 분리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칼빈에 따르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된 바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accept), ‘소유하고’(possess), ‘신뢰하는’(trust) 것이며, 이는 구원의 확실한 도구가 된다”(Inst. III.2.6). 여기서 칼빈은 ‘받아들임’(accept)을 복음적 믿음의 본질로 정의하며, 이는 곧 ‘람바노’(λαμβάνω)적 결단과 ‘데코마이’(δέχομαι)적 환대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바빙크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믿음이다"(Reformed Dogmatics, Vol. IV: Holy Spirit, Church, and New Creation, Baker Academic, 2008, p. 123)라고 말함으로써, ‘받는다(receiving)’는 개념을 통해 ‘람바노’(λαμβάνω)의 능동성과 ‘데코마이’(δέχομαι)의 내적 환대를 아우르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한다.
벌코프는 "믿음이란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신 모든 것에 의지하는 영혼의 행위이다"(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96, p. 503)라고 함으로써, ‘받는다’는 동사를 통해 ‘람바노’(λαμβάνω)의 적극적 수용을, ‘의지한다’에서 ‘데코마이’(δέχομαι)의 겸손한 수용과 신뢰를 나타낸다.
종합하면, ‘람바노’(λαμβάνω)는 믿음의 ‘능동적 수용’(결단)을, ‘데코마이’(δέχομαι)는 믿음의 ‘수동적 환대’(겸손한 수용 태도)를 나타낸다. 개혁신학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믿음의 총체적 구조로 설명한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를 능동적으로 ‘붙잡는 람바노’(λαμβάνω)이자,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코마이’(δέχομαι)이다. 개혁신학은 이 둘을 통합하여 구원의 유일한 도구로 설명한다.
따라서 ‘람바노’(λαμβάνω)와 ‘데코마이’(δέχομαι)를 서로 이질적인 이원적 개념으로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다락방의 영접 개념을 비난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며, 본질적 의미에 대한 자의적이고 억지스러운 해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분석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므로 다락방이 사용하는 ‘영접’ 표현을 특정 헬라어 단어에 결부시켜 이단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이며, 이러한 주장은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3. '재영접설' 주장에 대한 신학적 반박
J 목사는 다락방이 '믿는 단계'와 '영접 단계'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구원을 반복하게 만드는 ‘재영접’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구속사의 인격적 수용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기술하는 방식일 뿐, 실질적 반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석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람바노’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며, ‘피스튜오’(πιστεύω)는 내적 신뢰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1:12은 이 둘을 함께 사용하여 구원의 전인격적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영접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의 두 표현”이라고 보았다. 머레이 또한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나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하였다.
믿음과 영접은 구속의 과정에서 동일한 것의 다른 국면을 뜻하며, 상호 분리하지는 않지만 강조점의 차이는 존재한다.
믿음이 내적 상태라면, 영접은 그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락방에서 ‘믿는 단계’와 ‘영접 단계’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나 교리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신앙 행위의 내적 상태와 외적 표현의 구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내적 신뢰(피스튜오), ‘영접’은 그 외적 표현(람바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신앙 행위로서 동일한 사건의 내외적 국면이다.
다락방은 구원을 시간적으로 반복하거나 다시 영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과정에서 확신을 갖도록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할 뿐이다.
4. '지방교회와의 유사성' 주장에 대한 반박
지방교회와 다락방전도운동은 역사, 조직, 신학 노선, 훈련 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억지로 양자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이는 단지 ‘영접’이라는 용어의 표면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하여, 다락방이 지방교회의 교리를 차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신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30년 이상 다락방의 훈련 자료와 강의 어느 곳에서도 지방교회의 교리가 언급되거나 차용된 사례는 없으며, 교리적으로도 다락방전도운동은 개혁주의 정통 신학 위에 분명히 서 있다.
5. 결론
다락방전도운동에서 말하는 ‘영접’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과, 믿음의 도구적 역할이라는 교리적 구조에 부합한다. 그러나 J목사가 주장하는 이른바 ‘재영접설’은 자의적 해석과 신학적 무지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헬라어 ‘람바노’(λαμβάνω)와 ‘데코마이’(δέχομαι)를 인용하고 해석하지만, 구속 사역에 있어 이 두 단어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차이점에만 집착하여 해석상의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다락방의 ‘영접’ 개념을 왜곡하고,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교단 교재나 선교단체의 ‘영접’ 개념과의 공통성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다락방만을 ‘이단 프레임’에 가두려는 태도는 정당성을 결여한 비판이다.
신학적 논쟁은 신중한 본문 해석과 정통 교리에 기초해야 하며, 성급하고 책임 없는 이단 규정은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의 일치를 해치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락방의 ‘영접’ 개념을 일방적으로 재구성하여 왜곡한 사실에 대해 정직하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